
이른 저녁을 먹고 둘째와 신랑은 집에 남겨두고, 가방에 책을 담아 집 근처 카페로 향했다. 내가 자주 앉던 자리는 이미 다른 이에게 선점되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개방된 자리에 앉았다. 내 사랑 카페라떼와 책이 있기에,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 책은 작가가 20여 년간 몸 담았던 회사를 퇴사한 후, 그토록 바랐던 파리에서 두 달간 머무르며 쓴 에세이다. 나 역시 20여년 전쯤 친구들과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했고,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내가 유명한 에펠탑 앞에 서있고,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지만, 짧은 일정에 유명한 곳에 점찍기 바빠 파리에서 깊은 감동은 느끼지 못했다. 나에게는 별다른 의미도, 느낌도 없었던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꿈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다.
책을 통해 처음 파리와의 인연을 느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과 함께 파리를 거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평범한 가이드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치 노랫말처럼 아름다워서 듣는 내내 귀를 기울이게 하고, 중간중간 소소한 유머로 웃음을 자아낸다.
나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기 위해 원하지 않는 출근과 정신없는 일상을 같이 보낸 작가님이 쓴 여행기라 더 큰 위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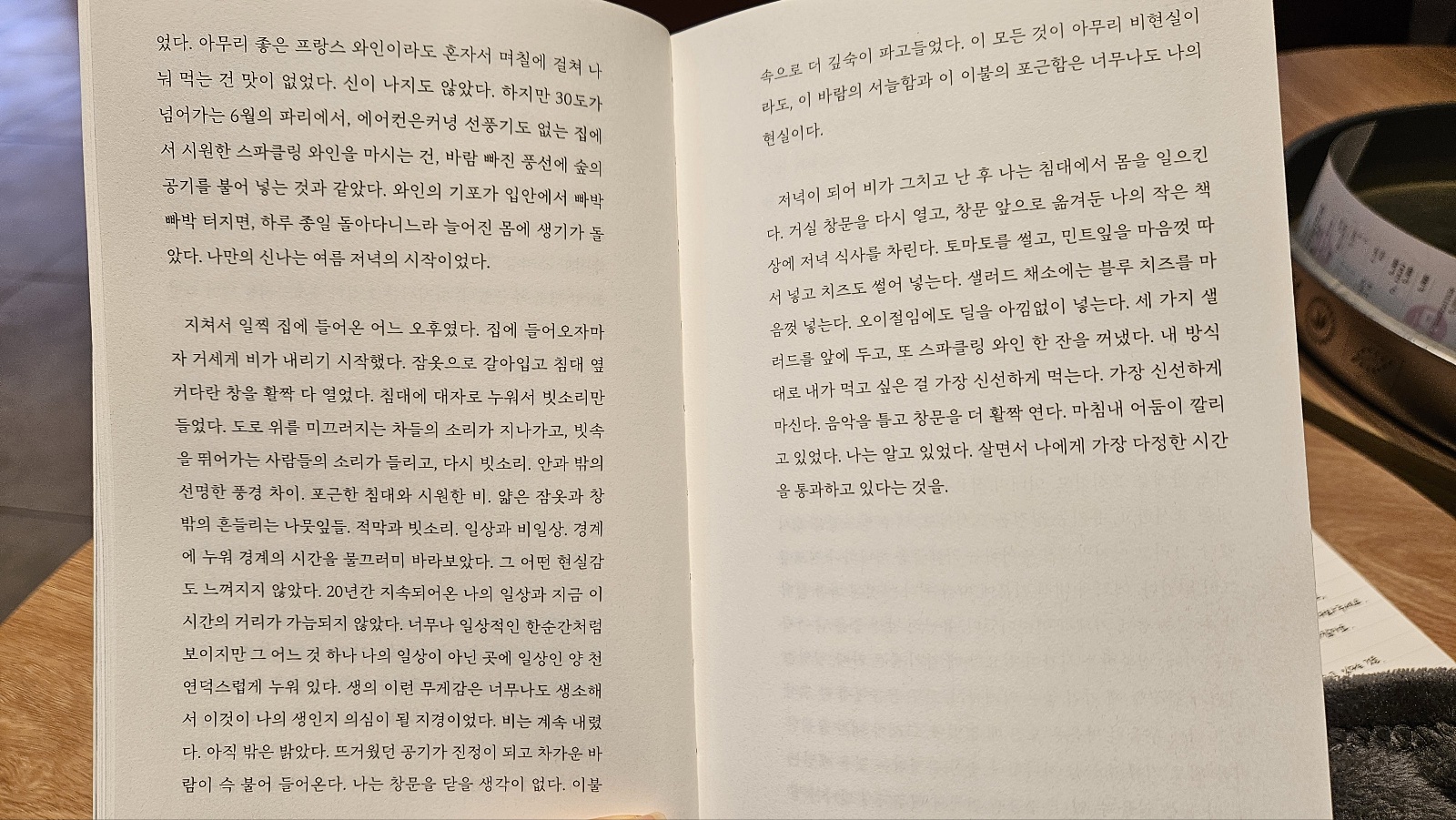
나도 작가님과 같은 침대에 누워 빗소리를 듣고,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서늘한 기운 속에 느껴지는 이불의 포근함까지도.
나는 나에게 다정한 시간을 얼마나 선물하고 있을까? 그러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이 시간도 나에게는 꽤 다정한 시간이다.

미술관에서 모네의 <수련>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린 친구를 보며, 저자는 친구의 눈물을 재채기에 비유했다. 재채기를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날씨 좋은 6월의 저녁, 해가 지기 전 가장 아름다운 빛이 찾아올 때 뷔트 공원에서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다.
곧 넘어가는 해가 금가루를 온 세상에 뿌리면 그 노란 기운을 받아 나뭇잎도, 물도,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모두 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고선 책을 두 장 넘기니, 내가 상상한 장면이 생생한 사진으로 나타났다. 사진을 보고, 다시 문장을 읽고. 내가 상상한 장면과 비교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저자는 자신을 그토록 바라던 미래에 자신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애써 마련한 지금을 벅차게 사랑한다. 나도 내가 그토록 꿈꾸는 미래로 나를 데려 가고 싶다. 아니 갈 것이다. 아니 데리고 간다. 그리고 거기서 매일매일을 감사해하며 행복하게 보낸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간다'.